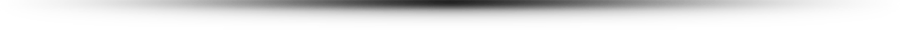공짜 영상통화를 하면서
초등학교 자연시간에 종이로 컵을 만들어 밑에 구멍을 뚫고 실로 연결하여서 또 다른 종이컵에 연결하였습니다. 이 컵 안에 말을 하고 저 너머에 있는 상대방이 귀에 대면 소리를 보다 가깝게 들을 수 있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알렉산더 그래함 벨이 전화를 만들었습니다. 음성을 전류로 바꾸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방에게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전화는 가정집에는 거의 없고 큰 가게나 엄청난 부잣집에나 있었습니다. 옆에 붙은 핸들을 돌려서 상대방을 호출하는 까만 자석식 전화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후에는 앞에 동그랗게 구멍이 10개가 있고 그 속에 각 숫자를 손가락으로 돌려서 전화를 걸게 하였던 다이얼식 전화가 보급되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집에는 한 두 개가 있을까 말까 그리고 관공서에서만 볼 수 있는 전화였습니다.
그 때만해도 전화를 하나 놓으려면 많은 돈을 지불하여야만 하였습니다. 필요는 많은데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생겨진 현상입니다. 상업화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장비와 회선부족으로 전화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몇 대가 배정되면 청약을 받아서 수십 대 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당첨이 되면 횡재를 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때 전화를 사고파는 것과 함께 임대하는 전화전문 상점도 생겨났습니다.
지역적으로 번호 몇 대를 받은 다음에 사설로 교환기를 마련하고 여러 세대가 나누워서 사용한 곳도 많았습니다. 일반 관공서는 물론이지만 지역적으로도 그것을 사업으로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때는 전화교환수는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시외 전화는 요금이 비싸서 잘 하지 못하고 우체국이나 전화국에 가서 요금 생각하며 짧게 요점만 말하고 빨리 끊어야 했습니다. 이 때에 개인 소유가 인정되는 ‘백색전화’는 그 번호 값이 두 대만 있으면 거의 작은 집을 살 정도의 귀한 몸이었다고 합니다.
다방은 서로 만나는 약속의 장소였지만 중요한 통신소가 되어 돈을 받고 전화를 걸고 바꿔주곤 하였습니다. 차를 마시다 보면 ‘아무개 사장님!’ 이름을 부르며 호출하는 소리가 자주 들려왔습니다. 70년대 후반부터 시내 곳곳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서 서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0년대에 들어서서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면서 전화 공급이 많아졌고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 그리고 휴대전화의 시대가 도래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근에는 서로 상대방과 마주보면서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팔뚝만한 ‘모토롤라’에서 손바닥 보다 작은 크기의 스마트폰으로 변신하였습니다. 4천만대의 보급률을
자랑하며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공짜로 지구촌 어디에서나 wifi와 데이터만 쓸 수 있다면 서로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영상통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명절에 혹시나 찾아뵙지 못하는 집안의 어른들이나 자녀들에게 무료로 얼굴을 보면서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할 천국의 시간이 있을 것도 믿음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